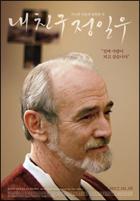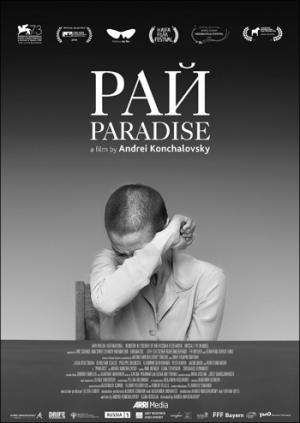<필름포럼 프로그래머>
1980년 윔블던 테니스대회 결승전. 스웨덴의 테니스 영웅이자 윔블던 4회 우승에 빛나는 ‘미스터 아이스’ 비에른 보리가 서브를 넣는다. 맞은편 코트엔 테니스계의 떠오르는 신성, 미국 ‘코트의 악동’ 존 매켄로가 보리의 서브를 응수한다.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게임 중 하나로 회자되는 빅 매치가 막 시작됐다. 보리는 그 누구도 아직 이루지 못한 윔블던 대회 5회 우승에 도전하고 매켄로는 이를 저지해야만 한다. 목표를 향해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나의 모습이고 아버지들의 모습이다.

스포츠는 이기고 정복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날것으로 드러낸 한 형태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 선수는 상대방을 이겨야하고 관중은 그것을 지켜본다. 아마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공평한 기회를 최대한 살려내어 자기 것으로 가져오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 격파하는 짜릿함에 사람들은 열광하는지도 모른다. 물론 그것의 전제는 공평함이다. 보리와 매켄로도 이 공식에 충실히 따른다.
비에른 보리는 별명처럼 차갑게 냉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루틴을 중시한다. 반면에 매켄로는 자신의 모든 열정을 코트에 내던지고, 관중에게도 미디어에게도 때론 욕설을 내던진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들의 목적은 단 하나다. 이기기 위해서.
야누스 메츠 감독이 연출한 이 긴장감 넘치는 스포츠 드라마의 플롯은 극단적 성격의 두 주인공을 시종 일관 대비시키며 마지막 파이널 결승전, 한 게임을 위해 계속 치고 나간다. 아주 심플하다. 그러나 마지막 게임의 서브 한 방처럼 강렬하고 무엇보다도 재밌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마치 그날의 빅 매치를 보던 윔블던 대회의 관중들처럼 두 주인공 캐릭터에 몰입되어 함께 긴장하고 흥분한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보는 것 같기 때문이다.
비에른 보리 역엔 스웨덴 출신의 배우 스베리르 구드나손이, 매켄로 역엔 헐리우드의 악동 캐릭터, <트랜스포머>의 샤이야 라포프가 각각 맡았다. 스크린에 동화되어있는 동안 그들은 마치 진짜 비에른 보리와 존 매캔로가 현생 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보리는 윔블던 대회기간 동안 언제나 같은 차를 타고 같은 호텔에서 묵고 똑같은 라켓 50여 개에 같은 장력을 유지하기 위해 테니스 줄을 당기고 조인다. 그러나 이미 최연소 윔블던 챔피언이자 4연패에 빛나는 그의 업적은 패배에 대한 중압감을 떨쳐 버리기 어렵기 만든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 그가 사는 모나코의 고층 아파트 발코니에서 바라본 세상은 더없이 푸르고 청아하지만, 발코니를 움켜쥐고 물구나무 선 듯한 위태로운 동작에서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의 처지를 관객은 실감할 수 있다.
반면에 떠오르는 신성 존 매켄로는 TV 토크쇼에 출연해서도 자신에게 현재 챔피언인 비에른 보리에 관한 질문과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진행자와 미디어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듯하지만 그 열정을 투쟁심으로 치환해버려 매 경기에 집중한다. 둘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최고의 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 경기로 이어지고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비에른 보리가 5연패라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이루어내지만, 이듬해의 윔블던 결승에서는 존 매켄로가 마침내 보리를 꺾고 우승한다. 그리고 보리는 바로 은퇴를 선언한다. 아마도 충분히 이룬 듯 보인다. 어쩌면 이것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일지도 모른다.
나는 충실한가? 만약 열정이 있다면, 곧 우리의 삶도 최고의 순간을 곧 맞이할 것이다.